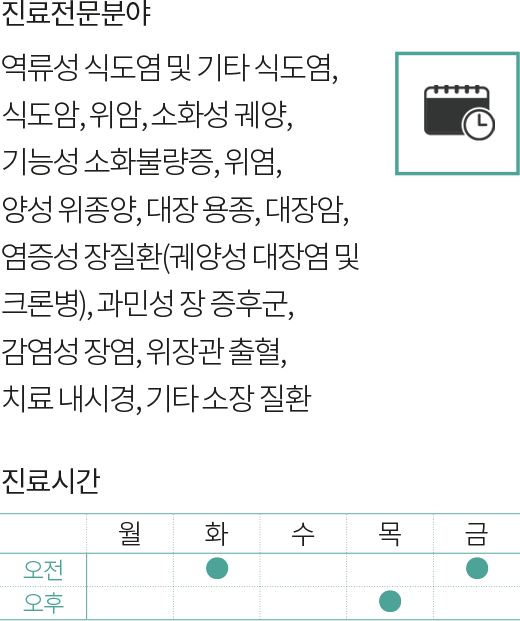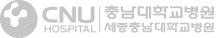곁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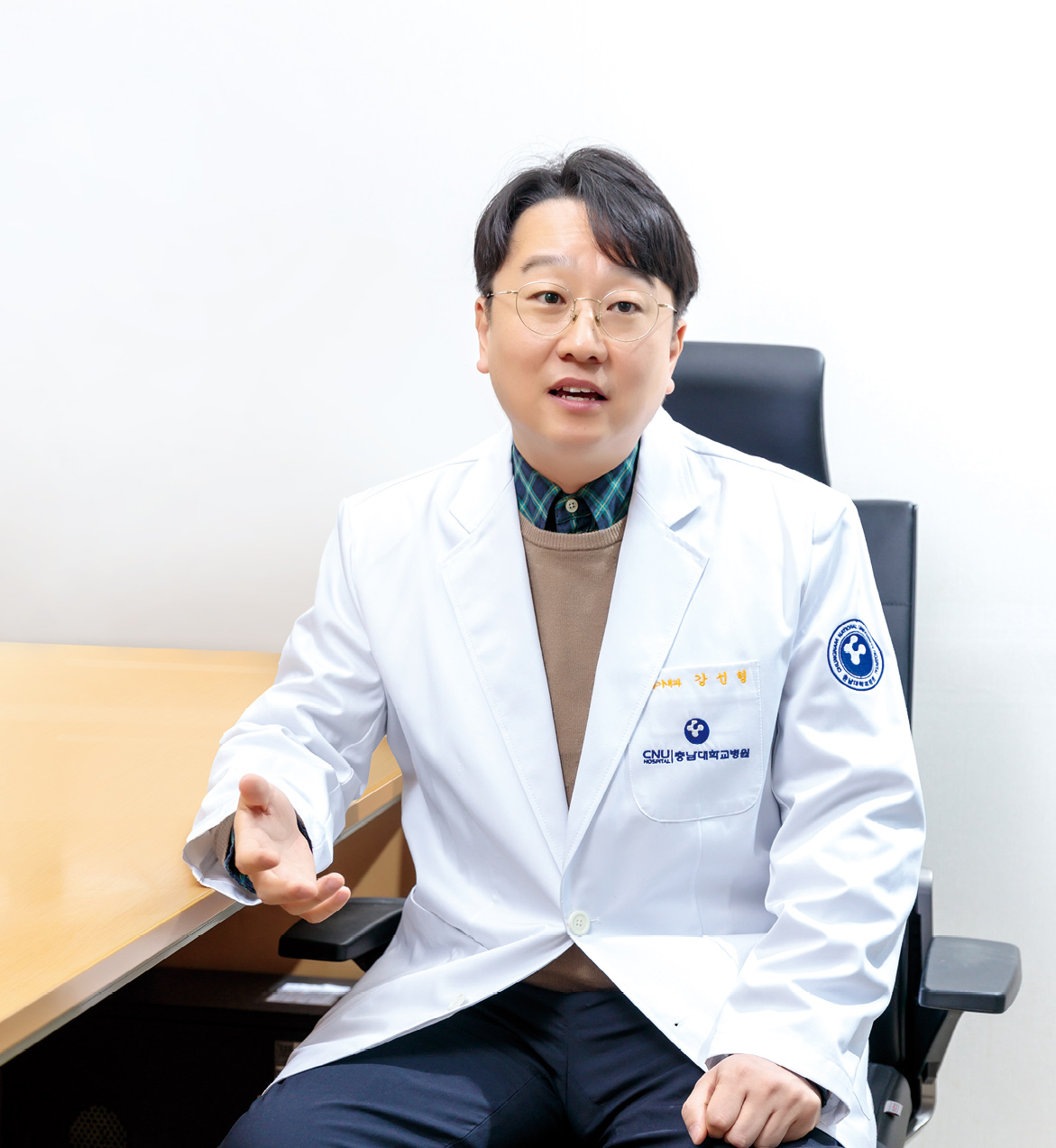
크론병은 과거에는 드문 병이었으나, 최근 젊은 층에서 증가하면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질환이 되었다. 1932년 크론 박사가 처음 보고한 이후 서양에서는 많은 사례가 발견됐고, 최근 국내에서도 발생률이 꾸준히 늘고 있다.
크론병의 주요 원인, 장내 면역 시스템 문제로 추측
크론병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장내 면역 시스템의 이상이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정상적인 장의 면역 체계는 우리 장 속에 존재하는 정상 장내세균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에 대해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그러나 병원균이 침입하면 백혈구와 같은 염증 세포를 장 점막으로 불러들여 이를 방어합니다. 이와 같은 장의 면역 억제 기전을 ‘면역 관용(Immune tolerance)’이라고 부릅니다. 크론병 환자는 면역 관용이 손상되어 정상 장내세균이나 외부 물질에도 과도한 면역 반응이 발생하고, 결국 특별한 원인 없이도 장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는 주로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외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도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에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
크론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 설사, 혈변, 발열입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장과 장, 또는 장과 피부나 방광 사이에 샛길이 생기는 누공이 형성되어 피부나 소변으로 고름이 새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장과 장 사이의 유착으로 인해 복부에서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고,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장이 좁아지는 협착이 발생하여 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염증일 경우 장에 천공이 생기거나 출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크론병은 주로 15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중장년층에서는 드물지만 60세 이후 다시 발생률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내시경과 영상 검사를 통한 진단
크론병 진단은 환자의 임상 양상과 혈액 검사, 내시경 검사, 복부 CT와 MRI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이뤄집니다.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발생할 수 있어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캡슐 내시경이 진단에 유용합니다. 다만 소장에만 침범해 협착이 있으면 내시경 검사가 어려워 CT나 MRI를 이용한 검사가 선호되기도 합니다.
장 염증 줄이는 면역 억제 요법
최근에는 염증 반응을 더욱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와 표적 치료제가 치료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플릭시맙과 아달리무맙 같은 항-TNF 제제뿐만 아니라, 장 점막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베돌리주맙(Vedolizumab)과 인터루킨-12/23을 억제하는 우스테키누맙(ustekinumab)이 있습니다.
이들 약제는 모두 중등도에서 중증 크론병 환자에서 1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장기적인 관해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JAK1 억제제인 우파다시티닙(upadacitinib)이 도입되어, 기존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구 복용이 가능하고 빠른 효과 덕분에 임상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는 3차 치료제로 보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에 따른 종합 맞춤형 치료
치료 옵션이 다양해짐에 따라 환자의 질병 상태, 약제 반응 여부, 부작용 위험, 생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치료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치료의 발전은 단순히 염증을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합병증을 예방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기부터 적절한 약제를 선택해 꾸준히 관리한다면 크론병 환자도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론병은 더 이상 두려운 병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