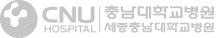함께 듣는 이야기
1월호 테마인 ‘손’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손, 생각이 되고 말과 몸짓이 되다
눈을 비비고, 숟가락을 들고,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자판을 두들기고…. 우리는 하루 종일 끊임없이 손을 사용한다. 당장 이 책을 보기 위해서도 손으로 종이를 넘겨야 한다. 아마도 인류는 이렇게 수만 년 간 손을 사용해 왔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뇌 용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한다. 이 예민하고 뛰어난 감각기관이 우리의 뇌를 자극했고, 그래서 ‘창조성’이 발휘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문명의 발달은 우리를 점점 ‘손도 까딱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경고장을 내민다. 인류의 진화를 위해 어서 손을 사용하라고 말이다. 우리에게 손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들어보자.
우리 몸의 일부 ‘손’
 신체에서 ‘손’은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을 지칭한다.
손등, 손바닥과 거기서 뻗어 나온 다섯 개의 손가락이있어 뭔가를 잡거나 만지고, 미는데 주로 사용한다.
약 30개의 뼈로 이뤄져 있고 손가락 끝마디 위쪽에는 피부의 일부가 변한 손톱이 있다.
손바닥 피부는 다른 곳보다 두껍고(약0.7㎜) 털은 없으며 손금과 지문이 있다.
수상학에서는 손금이 여러가지 의미로 읽히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손금은 손바닥과 손가락을 굽히면 생기는 굵은 주름(운동추벽, 運動皺襞)일 뿐이다.
손의 뒷면인 손등은 피부가 얇고(0.4㎜) 다른 부위의 피부와 비슷하다.
손과 관련한 질병으로는 이번 호 ‘테마 진료실’에서 다루게 될 방아쇠 수지, 중수 수지 관절, 백조목 변형, 단추 구멍 변형 등이 있다.
신체에서 ‘손’은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을 지칭한다.
손등, 손바닥과 거기서 뻗어 나온 다섯 개의 손가락이있어 뭔가를 잡거나 만지고, 미는데 주로 사용한다.
약 30개의 뼈로 이뤄져 있고 손가락 끝마디 위쪽에는 피부의 일부가 변한 손톱이 있다.
손바닥 피부는 다른 곳보다 두껍고(약0.7㎜) 털은 없으며 손금과 지문이 있다.
수상학에서는 손금이 여러가지 의미로 읽히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손금은 손바닥과 손가락을 굽히면 생기는 굵은 주름(운동추벽, 運動皺襞)일 뿐이다.
손의 뒷면인 손등은 피부가 얇고(0.4㎜) 다른 부위의 피부와 비슷하다.
손과 관련한 질병으로는 이번 호 ‘테마 진료실’에서 다루게 될 방아쇠 수지, 중수 수지 관절, 백조목 변형, 단추 구멍 변형 등이 있다.
또 하나의 뇌 ‘손’
 근대 철학의 문을 연 철학자 칸트(1724~1804)는 손을 두고 ‘바깥으로 드러난 또 하나의 뇌’라고 부르며 손에 위대한 영감을 부여했다.
이후 손-두뇌의 관계를 비롯, 두뇌 각 영역의 기능이 밝혀지기까지는 반세기가 넘게 걸렸다.
1930년대 미국 신경과 의사인 펜필드는 인간의 대뇌와 신체 부위의 대응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피질 소인’을 발표했는데,
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위가 바로 손이었다.
이 면적만으로 사람 모형(homunculus)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엄청난 크기의 손을 가진 난쟁이처럼 보인다.
손을 ‘또 하나의 뇌’라고 칭했던 철학자의 상상력이 증명된 셈.
칸트의 천재적인 상상력은 혹시 어릴 적부터 가죽세공인인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손을 많이 사용했기때문은 아닐까.
근대 철학의 문을 연 철학자 칸트(1724~1804)는 손을 두고 ‘바깥으로 드러난 또 하나의 뇌’라고 부르며 손에 위대한 영감을 부여했다.
이후 손-두뇌의 관계를 비롯, 두뇌 각 영역의 기능이 밝혀지기까지는 반세기가 넘게 걸렸다.
1930년대 미국 신경과 의사인 펜필드는 인간의 대뇌와 신체 부위의 대응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피질 소인’을 발표했는데,
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위가 바로 손이었다.
이 면적만으로 사람 모형(homunculus)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엄청난 크기의 손을 가진 난쟁이처럼 보인다.
손을 ‘또 하나의 뇌’라고 칭했던 철학자의 상상력이 증명된 셈.
칸트의 천재적인 상상력은 혹시 어릴 적부터 가죽세공인인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손을 많이 사용했기때문은 아닐까.
수 만 가지 ‘손’의 의미
 손을 향한 영감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어마어마하다.
우리는 신체적 의미의 ‘손’보다는 다른 뜻으로 더 많이 이 낱말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보자.
일하는 사람이 부족할 때 쓰는 말이 ‘손이 부족하다’ ‘손이 달린다’이다. 여기서 손은 ‘일손’으로, 일하는 주체가 손이라는 의미다.
또 ‘손이 많이 간다’고 할 때의 손은 그만한 노력과 정성을 뜻한다.
무언가를 ‘손에 넣다’는 표현은 또 어떤가.
이때 손은 ‘영향력’을 의미한다.
이런 얘는 무수하다.
‘손에 놀아나다’ ‘손을 거치다’ ‘손을 걸다’ ‘손을 내밀다’ ‘손을 벌리다’ ‘손을 씻다’. ‘손이 크다’ ‘손에 땀을 쥐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다’
‘손을 맞잡다’ ‘손이 닳도록’….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또 있을까.
손으로 하는 행동은 또 어떤가. 친밀감의 표현도 손을 맞잡아 흔드는 악수로 한다.
악수는 중세 서양에서 기사들이 싸울 의지가 없음을 보이기 위해 오른손을 내밀던 것에서 유래한다.
무기를 쥐던 오른손이 빈손임을 보여줌으로써 화해를 약속한 것이 지금의 악수로 자리 잡았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쓰는 ‘수화’, 선수와 감독이 주고받는 ‘싸인’ 등에서 손은 제 2의 언어다.
손을 향한 영감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어마어마하다.
우리는 신체적 의미의 ‘손’보다는 다른 뜻으로 더 많이 이 낱말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보자.
일하는 사람이 부족할 때 쓰는 말이 ‘손이 부족하다’ ‘손이 달린다’이다. 여기서 손은 ‘일손’으로, 일하는 주체가 손이라는 의미다.
또 ‘손이 많이 간다’고 할 때의 손은 그만한 노력과 정성을 뜻한다.
무언가를 ‘손에 넣다’는 표현은 또 어떤가.
이때 손은 ‘영향력’을 의미한다.
이런 얘는 무수하다.
‘손에 놀아나다’ ‘손을 거치다’ ‘손을 걸다’ ‘손을 내밀다’ ‘손을 벌리다’ ‘손을 씻다’. ‘손이 크다’ ‘손에 땀을 쥐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다’
‘손을 맞잡다’ ‘손이 닳도록’….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또 있을까.
손으로 하는 행동은 또 어떤가. 친밀감의 표현도 손을 맞잡아 흔드는 악수로 한다.
악수는 중세 서양에서 기사들이 싸울 의지가 없음을 보이기 위해 오른손을 내밀던 것에서 유래한다.
무기를 쥐던 오른손이 빈손임을 보여줌으로써 화해를 약속한 것이 지금의 악수로 자리 잡았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쓰는 ‘수화’, 선수와 감독이 주고받는 ‘싸인’ 등에서 손은 제 2의 언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