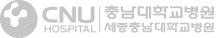함께 듣는 이야기
2월호 테마인 ‘얼굴’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얼굴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에게 우리는 보통 ‘얼굴 한 번 보자’고 말한다. 얼굴 보는 일이 곧 만나는 일이며, 얼굴이 곧 그 사람이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있다. 하지만 핵가족화, 서구화, 정보화된 사회는 얼굴없는 대화를 더 익숙하게 만든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도 각자 다른 지인과 스마트폰 대화를 나누고,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웹에서 이웃이 되는 것도 낯설지 않다. 오늘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얼굴, 마음의 잣대
얼굴은 입과 코, 눈이 있는 머리의 앞쪽면으로 우리 몸 중 시간이 흐를수록 가장 많이 형태가 변한다. 크게 얼굴은 얼굴뼈(코뼈, 광대뼈, 윗턱·아랫턱뼈)와 근육(씹기근육, 얼굴근육), 눈썹과 수염, 머리카락 등으로 이뤄진다.
이중 얼굴근육은 안면신경의 지배를 받아 감정의 변화를 표정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표정근이라고도 부른다. 또 눈 깜빡이기, 입맞춤을 위해 입술 오므리기, 정확한 발음하기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씹기근육(저작근)은 이름처럼 음식을 씹는데 주로 사용한다. 보통 아래턱을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을 통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이 저작근의 힘은 30~70㎏의 무게가 가해지는 것과 비슷한 강도다. 볼 양쪽의 씹기근육이 많이 발달해서 비대해지면 사각턱의 얼굴 모양을 만들기도 한다.

얼굴은 자연도태 되지 않는다
71억 명의 인류는 다른 종과는 달리 대부분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 펭귄과 원숭이의 얼굴을 떠올려 보자. 얼굴이야 말로 인간 고유의 증표가 아닌가.
지난해 세계적인 과학전문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실렸다. 인간이 저마다 다른 얼굴을 갖도록 진화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얼굴과 관련한 유전자 특성이 다른 신체 부위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다리가 긴 사람이 팔도 길고 손도 크지만, 얼굴이나 코의 생김새와는 무관하다는 의미다.
이와 더불어 생존에 유리한 특성이 살아남는 ‘자연선택’이 얼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냈다. 즉 오래된 인류의 얼굴이 지금까지 모두 살아남은 것이다. 얼굴만의 독립적인 진화과정은 인류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하다.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얼굴이 없다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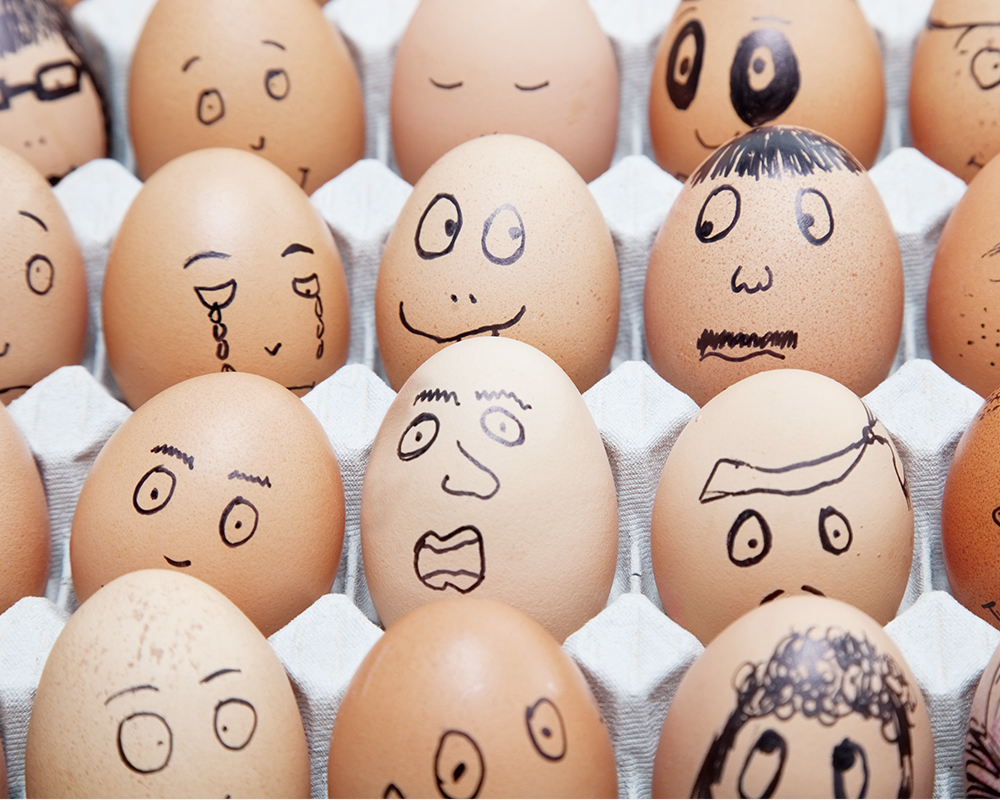
아름다운 얼굴이란
얼굴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미인(美人)’의 기준은 뚜렷이 변해왔다. 고대소설이 묘사한 옛 한국여인의 아름다움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맥락이 있다. 눈은 쌍꺼풀이 없고 가늘어야 하며, 코허리는 낮고 둥글어야 한다. 전체적인 얼굴 윤곽은 보름달같이 복스러우면서 숱 많은 검은 머리칼을 특징으로 한다.
지금과는 사뭇 다르다. 잠시 조선시대 널리 읽혔던 소설 <박씨전>의 한 구절을 보자. ‘높은 코와 내민 이마며 왕방울 같은 큰 두 눈’. 재미있게도 추녀의 용모에 대해 조롱한 대목이다. 당시의 추녀는 더도 덜도 말고 딱 그 얼굴로 500여년 만에 한국 미녀의 기준이 된다. 아름다운 얼굴은 불변이 아니다. 지금 나는 어느 시대의 미인인가.


▲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 「미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