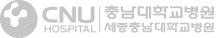기록
역대 병원장과 함께 충남대학교병원 43년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 글 박지선 | 사진 정인수
섬세한 리더십이 그려 낸 성장곡선
김 윤 제 13대 원장
그날도 어김이 없었다. 매일 1시간 씩 빠른 걸음으로 걷기. 김 윤 제 13대 충남대학교병원장(1993. 4. 1~1995. 3. 31)의 오랜 동안 비결이다. 청주효성병원장으로 부임한 후로 정오 즈음 가까운 무심천 4㎞를 걷는 게 일상이 됐다. 2009년 정년퇴임 이후 40여년 경력의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이곳의 원장으로 일한지도 벌써 7년 째.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가 무색해 보이는 김 윤 전(前) 원장을 일터에서 만났다.
원내 전화번호 바꾸는 데만 꼬박 1년
김 윤 원장은 당신을 “아주 운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한다. 퇴임 이후에도 오랫동안 현직에 몸담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남들은 평생에 한 번 하기도 힘든 ‘장’의 자리에 벌써 세 번째 오른 때문이기도 하다. 13대 충남대학교병원장과 현재 청주효성병원장 말고도, 1973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군 입대를 하면서 소령 때 201외과이동병원장을 맡기도 했다.
“법인화 직전 마지막 원장 시절이었어요. 대학 총장이 원장을 임명할 땐데 임명 바로 전날 연락이 왔습니다. 주변머리가 없어서 그런 기대는 안하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그렇게 13대 원장으로 부임한 해가 1993년. 충남대학교병원이 현재의 대사동 자리로 신축 이전 한 지 딱 10년 째 되던 해였다. 부임 첫해 김 윤 원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원 내 수관을 모두 바꾸는 일이었다.
“신축 이전한 후 10년 동안 수관은 한 번도 손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부턴가 원내 냉·온수가 자꾸만 막히는 겁니다. 파이프 단면을 잘라놓고 보니 안이 엉망이었죠. 녹슬고 이물질이 끼고…. 곧장 예산을 올려서 원내 모든 파이프를 동파이프로 교체하는 대공사에 들어갔어요.”
김 윤 원장의 리더십에 남다른 열쇠말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세심함이 아닐까. 이어 원장 임기 내 과업으로 1년 동안 공을 들였던 원내 ‘전화번호 바꾸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쓰이는 전화번호 체계가 바로 김 윤 원장 부임 시절에 자리를 잡았다.
특히 병동의 경우 각 호실이 그대로 전화번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83병동의 2호실(8302호실)일 경우 전화번호가 공통 국번 280에 ‘8302’인 식이다. 규칙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51병동의 2호실(512호실)의 경우는 앞자리에 7을 붙여 ‘7512’로, 직관적으로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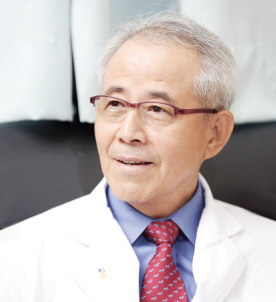
제 13대 원장
1993.4
1995.3
“그전까지 원내 전화번호가 뒤죽박죽이었어요. 호실별로 모두 번호가 달라서 병원으로 전화를 한 번 걸면 몇 단계를 거쳐야 병실로 연결되는 체계였는데, 이걸 바꾸는 데만도 꼬박 1년이 걸렸네요.”
전화번호만 바꾸면 되는 일이 아니라,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번호 체계에 따라 병동 숫자까지 모조리 개편해야 하는 ‘큰’ 공사였다. 생각은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수련을 마치며

원장 재임시절 원장실에서

1993년 병원보
“병원이 밥 먹듯 친절해야”
이외에도 2년 간의 원장 임기 동안 기쁜 소식들이 많았다. 부임 첫해 7월에는 기다리던 소아병원이 드디어 준공됐고, 이듬해에는 최신 MRI장비가 도입돼 해당 년도에만 2200여 건의 촬영이 이뤄질 정도로 환자수요가 많았다. 또 병상이 신축 이전 당시 499병상에서 783병상으로 증설되는 등 충남대학교병원은 1995년 법인화를 앞두고 한창 성장곡선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모 병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김 윤 원장은 “충남대학교병원이 정말 몰라보게 성장했지만 더 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친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를 호명할 때부터 ‘감사합니다. ○○○님’ 등의 존댓말을 쓰면 병원을 만나는 첫 느낌부터 달라집니다. 병원도 이제 친절을 밥 먹듯 해야 해요. 자원봉사자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하고 병원 고유의 서비스 정신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군에서, 국립대병원에서 또 현재 개인종합병원에서 각각 원장직을 맡은 김 윤 원장이 내놓은 이 말은 시대가 요구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