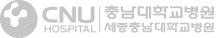따뜻한 마음
충남대학교병원이 지원한 환자 사례를 따뜻한 동화로 만나봅니다. | 글 백다함 | 자료제공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최영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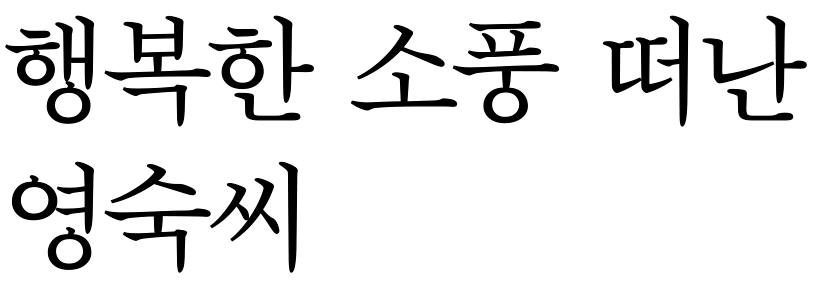
영숙씨는 4살, 7살 난 두 손주의 할머니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들을 대신해 손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할머니! 밖에 꽃 엄청 예쁘게 폈어요. 꽃놀이 가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손주들의 성화에 못 이겨 공원으로 나선 영숙씨는 갑자기 기침을
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아파?”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하얗게 질린 할머니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몸에 이상을 느낀
영숙씨는 곧장 병원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 검사결과를 전하는 의사선생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폐암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병원을 나선 영숙씨는 머릿속으로 남편과 아들, 그리고 두 손주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아프면 애들 밥은 누가
챙겨주나’
봄 꽃잎이 떨어진 길을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암 발병사실을 알게 된 이후 영숙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실낱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았지만 어느새 뼈까지 전이되면서
달리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결과만 돌아왔습니다.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영숙씨는 가족들과의 상의 끝에
고통스러운 암치료를 대신해, 마지막까지 편안한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호스피스 돌봄을 받기로 했습니다.
호스피스 의료진은 가장 먼저 어린 두 손주들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영숙씨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담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밤 할머니를 찾는 두 아이에게도 할머니와의 작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미술 심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아주 아주 많이요.”
기력이 쇠약해져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와중에도 영숙씨는 사랑스런 손주들을 볼 때면 잠시나마 활짝 미소를
지어보였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어느덧 겨울이 왔습니다. 영숙씨는 전보다 몸이 더 많이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의사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말씀해보실 수 있겠어요?”
“바다… 바다에 가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소풍을 다녀오고 싶어요.”
소박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씨의 몸 상태로 바다까지 가기엔 무리였지요.
대신 호스피스팀과 함께 병원에서 멀지 않은 호숫가로 향했습니다.
“참 좋다. 겨울인데도 하나도 춥지 않네….”
영숙씨는 그날 푸른 호숫가에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행복한 나들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영숙씨는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머나먼 하늘나라로 긴 소풍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좋은 꿈을 꾸는 듯 미소를 머금은 채 잠든 영숙씨를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이 글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호스피스 돌봄 서비스를 받은 김영숙(가명)씨의 사연을 동화로 재구성한 것으로 사실과는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숙씨는 특히나, 여전히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손주들과 아들, 남편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암 발병 사실을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호스피스 돌봄을 통한
상담으로 그런 마음을 치유하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따뜻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