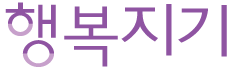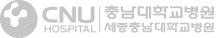따뜻한 마음
충남대학교병원이 지원한 환자 사례를 따뜻한 동화로 만나봅니다. | 글 봄 편집실 | 자료제공 호스피스완화의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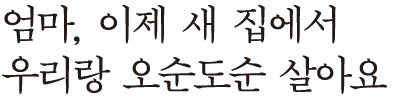
“뭐? 엄마가?” 오랜만에 걸려온 큰오빠의 전화에 희숙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작은오빠를 1달 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번에는 어머니 영자 씨가 말기 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희숙 씨는 통화가 끝나고도 한참을 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대전으로 모시고 와 직접 돌봐 드리기로.
“네 몸도 성치 않은데 내가 뭐 하러 올라가니?”
뇌졸중 치료 후 몸을 추스르고 있던 딸의 사정을 잘 알기에 자기 몸보다 딸 걱정이 더 앞섰던 영자 씨.
하지만 희숙 씨는 그런 엄마를 설득해 충남대학교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옆을 지켰습니다.
“걱정 말아요 엄마. 시어머니 편찮으실 때도 내가 쭉 돌봐 드렸잖아. 이 정도는 문제없어요.”
엄마 앞에서는 씩씩하고 든든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환갑을 넘겨 큰 병을 앓고 난 희숙 씨의 몸은 좀처럼 마음 가는 대로 따라 주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 몰래 화장실 칸에서 가쁜 숨을 고르는 날이 점차 늘어갔지요.
희숙 씨의 정성에도 엄마의 병세는 깊어졌고, 호스피스병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모녀의 소식을 들은 충남대학교병원 호스피스후원회는 차상위의료보호대상자인
영자 씨의 병원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어머니를 계속 돌봤던
희숙 씨를 위해서는 영자 씨가 충남대학교병원 일반 병동과 호스피스병동을
거쳐 희숙 씨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계속 간병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가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왔지요.
어머니를 집에서 편히 모시게 됐다는 안도감도 잠시, 희숙 씨는 영자 씨를 데리고 온 첫 날부터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환자를 돌보기에는 좁고 불편한 집 때문이었지요.
평소엔 신경 쓰지 못하고 살던 곳곳에 스민 곰팡이나 코를 스치는 퀴퀴한 냄새들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참에 좀 더 넓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하자!’
희숙 씨는 다음날부터 남편과 함께 틈틈이 부동산을 드나들며 새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영자 씨에게는 비밀이었지요. 이야기하면 당신보다 딸이 아픈 게 더 눈에 밟혀
‘됐다. 지금도 괜찮은데 힘들게 왜 이사를 해?’라며 말리실 게 뻔하니까요.
예상대로 영자 씨는 이사를 반대했지만, 결국 딸과 사위의 설득에 못 이겨 이사를 허락하셨답니다.
“그렇게 이사 노래를 부르더니, 오니까 좋아?”
“당연하지. 여기 봐, 이젠 엄마 방도 따로 있다.”
어린아이마냥 들뜬 희숙 씨를 보자, 영자 씨의 얼굴에도 그제야 미소가 퍼집니다.
어릴 때부터 살살 녹는 애교로 집안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막내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를 다 챙길 생각을 했는지, 어느새 희끗해진 머리카락과 주름이 하나 둘씩 자리 잡은 중년이 되었지만
엄마 눈에는 여전히 어릴 적 작고 귀여운 막내딸입니다.
※ 이 글은 충남대학교병원 호스피스후원회에서 병원비와 간병인 지원을 받은 최영자(가명)씨의 사연을 동화로 재구성한 것으로 사실과는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후원회에서는 차상위의료보호대상자인 영자 씨에게 병원비를 일부 지원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어머니를 간호한
막내딸 이희숙(가명) 씨를 위해 병원, 가정에 간병인을 지원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