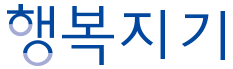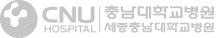동행 1
글+사진| 편집실, 자료제공| 교육수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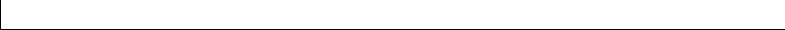
한 명의 직원이 의료의 미래를 바꾼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어떤 의료기관이 살아남을까?
지난 6월 16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의료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명품병원을 구현하기 위한 명품직장프로젝트Ⅱ 강의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학 전문 신문 <청년의사> 박재영 편집주간이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어떤 의료기관이 살아남을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박재영 편집주간은 한국 의료계가 처한 현실과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소개하고 미래엔 어떤 의료기관이 살아남을지에 대해 제시했다. 강연자의 탁월한 입담으로 강의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자.

급변하는 의료계, 성장의 한계에 부딪치다
강연이 시작되는 오후 5시가 다가오자 노인센터 5층 강당은 직원들의 발길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한 자리에 모여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던 직원들은 강연자가 강단에 오르자 하나둘 자리를 잡았다. 이날 박재영 편집주간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이야기를 담은 본인의 저서<개념의료>를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저는 지난 17년간 의학저널리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면 의사면허증이 있는 제게 물어봤지만 이제는 네이버에 먼저 찾아보죠.”
의료계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던지며 강연을 시작한 박재영 편집주간은 이어 한국에 의료보험이 도입되기까지의 힘겨운 과정을 설명했다. “건강보험제도 도입은 70년대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건강보험제도가 정착하기까지 80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특유의 근성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한지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박재영 편집주간의 주장이다.

이른바 3저 시스템, 저부담ㆍ저급여ㆍ저수가가 가입률과 같이 성장해야 하는데 가입률만 높고 나머지 수준은 아직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건강보험 도입으로 낮아진 의료수가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여태껏 망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 3가지 이유로 첫째, 국민소득의 증가 둘째,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 의료비 지출이 늘었다는 것 셋째, 과잉진료 등의 편법이 꼽혔다. 하지만 박재영 편집주간은 21세기엔 위와 같은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다고 말한다. “이제 의료비는 무한대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은 더욱 확대되고 있고요. 편법 또한 정보공개의 투명성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자경험 서비스가 답이다
강의 중반에 접어들자 박재영 편집주간은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명쾌한 설명부터 미국의 공보험 메디케어가 성공했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미래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일례로 예방의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수가를 낮춘 메디케어는 당뇨병 환자에게 식이조절 및 혈당관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발톱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해준다. 이전에 의료진이 수행하지 않았던 예방진료 서비스를 통해 실제 의료비는 매년 약 10%씩 낮아졌다.
“당뇨병 외에도 고관절 골절의 발병원인을 분석한 메디케어는 무료헬스장을 개장해 노인들이 근육을 단련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다. 고관절 골절로 인한 진료비가 연 5.000만 원, 80%가 줄었다는 것. 이 같은 수치는 전 세계 건강 공단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그렇다면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병원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그 답은 바로 환자경험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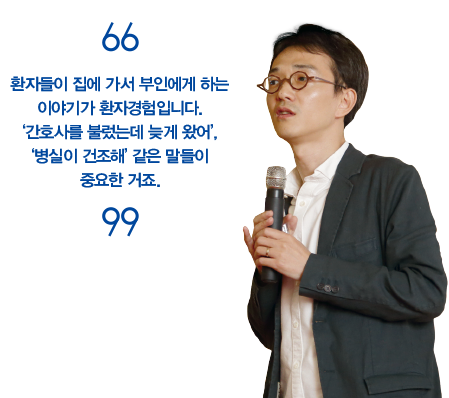
“환자들이 집에 가서 부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환자경험입니다. ‘간호사를 불렀는데 늦게 왔어’, ‘병실이 건조해’ 같은 말들이 중요한 거죠.” 박재영 편집주간 이같은 환자경험 서비스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병원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사들은 더 이상 관리자처럼 직원들을 감시해선 안 됩니다. 직원들 스스로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 알아서 움직이고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때 의료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